차(茶)와 수행(修行)이 계합(系合)된 까닭은 무엇이었나.
차가 머리와 몸을 맑게 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음을 안 것은 道家였다.
이들은 양생을 위하여 차를 십분 활용했는데,
달마의 면벽수행이 널리 퍼지면서 수마를 쫒기 위해 차를 마시게 된 것이다.
혜능이 남선종을 개창한 이후 차와 선 수행은 밀접해져 수행자의 필수품이 되다가,
마조의 제자 백장은 <백장청규>를 지었고, 조주선사의 <끽다거(喫茶去)>는 선가의 화두가 되기도했다.
한국에 차가 들어온 것은 신라 말 선종의 유입과 관련이 깊다.
고려시대에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귀족화된 차는 차 고유의 맑음이나 검박과는 거리가 멀어져서
조선 건국 후 차가 쇠퇴하는 단초가 되었다.
초의가 복원하고자 했던 차는 차가 지닌 맑고 시원한 기운이었다.
x x x
초의가 다산과 왕래하는 일을 대둔사 寺中에서는 탐탁치 않게 여긴 듯하다.
“ ‘근자에 어떤 요망한 산승이 유림으로 돌아갈 조짐이 있다’ 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저의 스승에게까지 들어가서 제 스승도 따라 의심하시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이런 말 때문에 스승님(다산)의 훌륭한 덕에 누가 될까 염려되어
마침내 왕래함이 드물어 마음 속이 거칠게 되었습니다.” -『일지암 문집』
과연 꼬질러바친 말이 허튼 말이었을까?
1830년 겨울, 상경한 초의는 두어 해를 한양에서 지내면서 수종사와 다산댁, 홍현주의 청량산방,
그리고 신위의 북선원과 금선암을 오가며 홍현주의 지인들, 신위, 정학연 형제들과 교유했고,
그가 갈고 닦은 선시의 시경(詩境)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1831년 정월 중순에 초의를 위해 마련한 청량산방 보상암의 아름다운 高會는 홍현주가 주관한 詩會로
윤정진, 이만용, 정학연, 홍희인, 홍성모 등, 장안의 명사들이 그의 별서에 모여 기량을 뽐냈다.
초의가 가져온 차는 이들에게 새로운 차의 경지를 경험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의 이러한 분위기는 박영보가 쓴 <남다병서>에 잘 드러나 있다.
허어! 하늘이 내린 조개종 총무원장 감이로세. 아깝네!
근데 ‘초의’ 이 냥반을 누가 ‘선사(禪師)’라고 불렀디야?
초의선사 / 다산도
다산가와 대둔사 승려들의 교유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다산이 강진으로 유배된 것은 1801년이다.
유산이 아버지의 적거지를 찾은 해는 1802년이고, 1805년에 다시 강진으로 내려왔다.
다산 父子가 보은산방에 머문 것은 이 무렵이다.
당시 다산은 사의제에서 궁색하게 지낼 때인지라 부자가 함께 거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산부자가 보은산방에서 三冬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아암 혜장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다산은 보은산방에서 수행하던 9人의산승에게 <주역>과 <예기>를 강학했는데,
바로 『승암예문』은 보은산방 승려들과의 문답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후일 대둔사 승려들이 경향의 사대부들과 교유하게 된 가교가 되었다.
특히 초의와 경화사족 간의 교유 확대는 '초의차'의 애호층을 넓히는 토대가 된다.

초의선사 / 월출산 백운동도
어떤 승려가 와서 편지도 전해받았고, 또 차 꾸러미도 받았습니다.
이곳의 샘물맛은 관악산의 한 줄기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두륜산 샘물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즈음에는 자못 참선의 선열에 대한 맛난 묘미를 느끼지만 이 묘체를 함께할 만한 사람이없습니다.
스님과 더불어 눈썹을 치켜세우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이 소망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강 졸서(拙書)가 있기에 부치니 거두어주십시오.
좋은 차(雨前)는 몇 관이나 따셨습니까.
어느 때나 연이어 부쳐주셔서 이 차에 대한 탐심을 진정시켜주시렵니까. 날마다 바라고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나원, 추사처럼 꽁짜 저렇게 대놓고 밝히는 사람은 첨 보네!
x x x
차의 근본은 기운이다.
색 · 향 · 미 는 차의 외연으로, 기운의 적합성을 밖으로 드러낸 잣대이다.
차의 진수, 다시 말해 차의 기운은 물을 통해 드러난다.
차는 물의 神이요, 물은 차의 體이다.
좋은 물이 아니면 색향기미를 드러내지 않고
잘 만들어진 차가 아니면 물의 본질을 엿볼 수 없다.
푸른 구름 바람결에 끊어질 듯 피어나고
엉킨 하얀 거품 찻잔에 어렸네
첫 잔은 입술과 목젖을 적셔주고
둘째 잔은 고민을 없애주네
셋째 잔은 삭막해진 마음을 더듬어
오천ㅇ 권의 문자를 떠오르게 하고
넷째 잔을 마시니 살짝 땀이 나는 듯
일상의 미덥지 않던 일, 땀구멍 사이로 사라지네
다섯째 잔은 몸을 맑게 하여
여섯째 잔을 마시니 신선과 통하네
일곱째 잔은 마시지도 않았는데
겨드랑이 사이로 맑은 바람이 스물스물 이는 것을 알겠구나
 초의선사 / 제주화북진도
초의선사 / 제주화북진도
1843년경 초의는 추사를 찾아 제주도 땅을 밟았다.
초의가 제주에서 지은 '영주답이연죽'을 지은 것은 1843년 여름이고
제주에서 말을 타다가 볼깃살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한 시기도 이 무렵이다.
완당선생시집의 '여초의(與草衣)'에 이 사실이 전한다.
말안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볼깃살이 벗겨지는 고통을 겪고 게신다 하니 염려가 됩니다.
큰 상처를 입은 것은ㅇ 아닌가요.
말을 듣지 않고 경거방동했으니 어찌 妄報가 없겠습니까.
사슴가죽을 아주 얇게 떠서 밥풀에 짓이겨 붙이면 좋습니다.
이는 스님의 살가죽이 사슴가죽과 견주어 어떤지를 보자는 것이지요.
사슴가죽을 붙인 후에는 곧바로 일어나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찌는더위가 괴로울 뿐입니다.
그럼. 1984년 윤7월2일 다문(茶門)
아니, 낫쌀 먹은 중이란 작자가!
말 타는 재미에 볼깃살 벗겨지는 줄도 몰랐다니?
조선 후기는 승려가 말을 타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었다.
초의가 말을 탈 수 있었던 것은 제주 목사 이원조의 배려였던 것 같다.
심혈을 기울여 쓴 추사의 <명선>에는 초의에 대한 고마움과 '초의차'에 대한 경외심이 함께 담겨 있다.
'명선'이 추사가 초의에게 준 호(號)라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진 것은 2004년쯤의 일이다.
'책 · 펌글 · 자료 > 예술.여행.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바티칸 박물관전 (0) | 2012.12.22 |
|---|---|
| 오페라 스토리 (0) | 2012.12.20 |
| 루체른 & 취리히 - 오페라 하우스 (0) | 2012.11.11 |
| 『우리 사발 이야기』& 이병창 컬렉션 (0) | 2012.10.27 |
| 도대체 끝이 없으니... (0) | 2012.10.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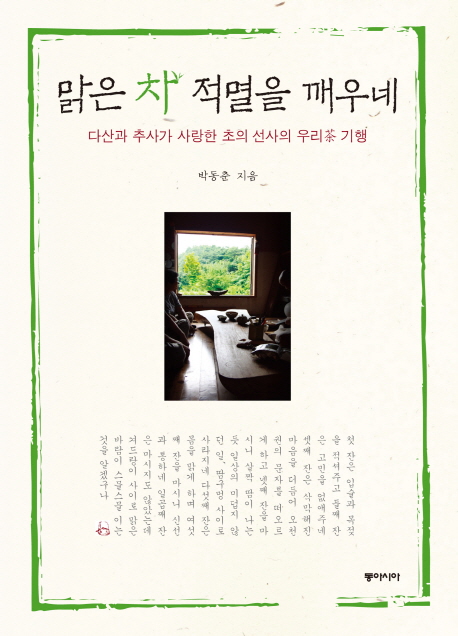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