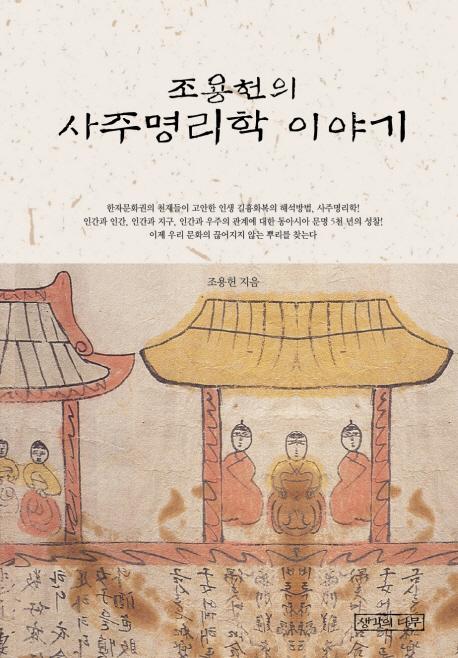경국대전에 나타나 있는 과거시험 분류를 보면 중인계급들이 응시하는 잡과(雜科)가 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문 기술직이다.
그 잡과 가운데 음양과가 있다. 天 · 地 · 人, 삼재(三才) 전문가를 선발하는 과거가 음양과이다.
세분하면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命課學)으로 나뉘어지고, 초시와 복시 2차에 걸쳐 시험을 보았다.
3년마다 초시에서 천문학 10명, 지리학과 명과학은 각각 4명을 뽑고, 복시에서 5명, 2명, 2명으로 뽑았다.
지리학은 풍수지리, 명과학은 사주팔자에 능통한 자였다.
명과학의 시험과목을 보면 『서자평(사주팔자)』『원천강(관상)』『 범위수(택일)』『 극택통서(?)』 등이다.
가장 대표적인 과목은 오늘날에도 필독서인『서자평(연해자평)』이다.
서자평은 900년대 사람으로 서자평의 명리학은 왕실과 소수 귀족 사이에서만 유통되는 비밀스런 학문이었다.
때문에 외국으로 쉽게반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고려말에 들어온 듯하다.
이들은 왕실전용 사주상담사들이라서 궁궐내에서만 근무하였으며 궁궐밖의 사람들과 접촉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업무의 성격상 왕실의 은밀한 내부 정보를 접촉하였기 때문에, 직급이 낮아도 함부로 볼 자리가 아니었다.
공주나 왕자의 궁합을 보는 일, 합궁할 때 택일하는 일, 왕자나 공주 출산시에 사주팔자를 기록하는 일,
그밖에 각종 건축이나 행사에 길일 잡는 일 등이었다.
명과학 교수는 왕자들의 사주팔자를 모두 알고 있어 대권의 향방에 관한 일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어의(御醫)와 더불어서 역모에 관련되는 일이 많앗던 매우 위험한 직책이기도 했다.
사주팔자가 반란사건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명리학 자체가 계급차별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후장상의 씨가 아니라도 사주팔자만 잘 타고나면 누구나 왕이 되고 장상이 될 수 있다는 기회균등 사상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풍수사상도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합궁일(合宮日)을 살펴보자.
사주팔자에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양대 요소는 입태일(入胎日)과 출태일(出胎日)이다.
입태일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는 날짜로서 합궁일이 된다.
출태일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탯줄을 자르는 바로 그 시각을 말한다.
사주팔자는 바로 그 탯줄을 자르는 시각에 들어온 음양오행 기운의 성분을 10간 12지로 인수분해한 것이다.
문제는 출태일 못지않게 입태일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투입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 될 사람의 사주가 불이 지나치게 많은 사주라 하자.
불(火)이 많은 사주는 반드시 물(水)이 보강되어야 한다.물이 많은 달은 음력으로 10월, 11월, 12월이다.
이 세 달은 돼지(亥), 쥐(子), 소(丑)로 상징되는데, 그래서 여름보다는 겨울에 합궁하느 것이 좋다.
날짜를 정할 때도, 시간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요즘에도 결혼할 때 신랑의 사성(四星-사주팔자)을 한지에 적어서 신부집에 보내는 풍습은 이에 따른 것이다.
¿
음양오행사상으로 인간과 우주를 총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도표가 바로 태극도(太極圖)'이다.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다시 오행이 나오고, 오행에서 만물이 성립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도표가 태극도이다.
태극도는 성리학자들의 우주관을 압축시킨 그림으로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예. 이황 성학십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명리학의 기본 원리가 바로 태극도라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주팔자를 보는 명리학자의 우주관이나 성리학자의 우주관이 아주 똑같다는 말이다.
성리학은 인간 성품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고, 명리학은 사람 운명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다.
성리학은 체제를 유지하는 학문이 되었고, 명리학은 체제에저항하는 반체제의 술법이 되었다.
성리학은 양지의 역사가 되었고, 명리학은 음지의 잡술이 되었다.
출처. 조용헌의 사주명리학 이야기
'책 · 펌글 · 자료 >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731부대 「이시이 시로」 (0) | 2011.06.07 |
|---|---|
| NERO (0) | 2011.06.07 |
| 허황옥 루트 & 중국의 서역행로 (0) | 2011.05.30 |
| 『동백꽃 지다』는 이런 책입니다. (0) | 2011.03.15 |
| [스크랩] 러시아의 20세기.. 예술의꽃 (0) | 2011.02.24 |